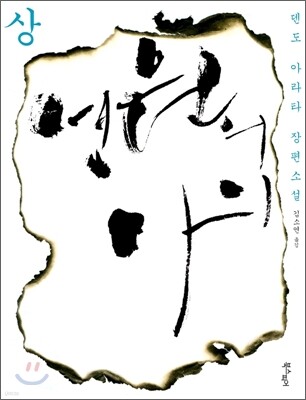유년기의 상처가 나머지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려낸 작품이다.
유키, 쇼이치로, 료헤이는 각각 부모로부터 비롯된 상처를 입고 소아 정신과 병동에서 생활하게 된다. 유키가 입소한 첫날, 그들은 운명처럼 서로를 알게 되고, 차차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병원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각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로 서로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17년 후 각각 간호사, 변호사, 경찰이 되어 재회한다. 세 명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오던 그들은 재회하면서 또 다른 사건들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사건과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
이 책은 유년 시절과 현재의 시점이 한 챕터씩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그 사건의 진실과 전말이 밝혀지는 구성이라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었다. 상과 하로 두 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720쪽, 848쪽으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자랑하지만 문장이 간결하고 이야기 전개가 빨라서 지루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이 책엔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과 부모에게 거는 기대,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들이 잘 반영돼 있어서 느끼는 바가 많다. 부모도 아이를 키우면서 나름의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사실 아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먼곳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안정된 부모의 삶이 아이의 삶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그것이 아이가 자라나는 자양분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내가 주로 주목한 건 아이와 부모의 관계, 주인공이 상처를 극복해내는 과정 따위였지만 이 밖에도 이 책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갖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비친다. 아래 내용은 출판사 서평에서 발췌.
원고지 5천 매에 달하는 묵직한 두께만큼이나 비장한 이 작품은 현대 사회의 ‘아동 학대’와 ‘가족 붕괴’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가정의 비극이나 슬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세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일깨운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어가는 개인의 역사가 끝없이 이어져, 자신과 얽혀 있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끼치고 받는지, 그로 인하여 이 세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이 작품은 보여 주고 있다.